
- 자료실
- 경제
경제
| 제목 | 공적 자금 투입만으로 금융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가? | ||
|---|---|---|---|
| 등록일 | 2003-12-23 | 조회수 | 22355 |
정부의 공적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입된 역사적 예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공황 때 미국에서의 일이다. 1932년 미국 정부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Reconstruction Finance Corp.를 설립하고, 이 공사는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 신탁회사, 저축대부조합 등에 지원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은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이 위험해졌을 때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저축대부조합의 경우는 FSLIC)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체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1980년대에 많은 은행과 저축대부조합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에 대해 FDIC와 FSLIC에 있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구제하였다. 그 결과로 이 두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1989년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FIRREA)를 제정하여 자금이 고갈된 FSLIC는 폐지하고 모든 공적 자금을 FDIC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Reconstruction Trust Corp.를 설립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의 자산을 처분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런 선례를 모방하여 여러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통해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달랐다. 미국의 경우는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이후 10여년간(1986-1996) GDP의 7% 가까이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는 은행위기 때 GDP의 6-8%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규모로서 제일 큰 국가는 칠레로서 은행위기 때 GDP의 30%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도 GDP의 14%를 투입하였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1997년까지 GDP의 7%를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기는 우리 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출하는 소위 엄격한 의미의 "공적 자금"은 그 동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64조원(GDP의 14%)이 투입되었으나 이보다 넓은 의미의 자금은 최대 113조원(GDP의 24%)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의 정부자금 투입은 거의 칠레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금융개혁은 아직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할 공적 자금(넓은 의미의 자금일 수도 있음)의 규모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적게는 30조원(정부 추정), 많게는 140조원(S&P's사 추정)에서 150조원(한국경제연구원 추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경제 연구원은 부실 기준을 미국기준에 맞출 경우 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GDP의 약 66%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개혁을 하고 그에 맞추어 이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 정말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큰 희생을 치르는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개혁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IMF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관치금융이었고 IMF 위기를 탈출하는 수단으로 실시한 1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그 방법이 IMF 이전과 같이 관치금융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30조원을 투입하건 150조원을 투입하건 극단적으로 300조원을 투입해도 우리 금융산업이 재경부의 꼭두각시로 남아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금융개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재경부의 꼭두각시로 남아있는 동안은 금융산업의 부실은 겉으로는 가려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없어질 수가 없으므로 재경부 관료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시 눈덩이처럼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은행들을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은행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로 인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력과 이를 통한 기업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특히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그 표면상의 이유로서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자기들의 영향력 감소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은행들을 재벌들에게라도 파는 것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를 크게 줄이는 길이 된다면 그래도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피해야 할 것인가?
3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국민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7백만 원이 넘을 것이고 15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각자 3백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잘 되어서 그런 자금이 전부 회수된다면 국민이 부담할 것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관치금융적 방법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정부가 소유하다시피 하고 있는 은행들을 민영화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국민부담을 최소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관치금융적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서 공적 자금이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부담을 최소로 줄인다는 장점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 해도 이것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며 경쟁이 심해지면 재벌의 입장에서도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공적 자금 운용위원회를 두어 이 자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고 "나 개인의 돈"이 아닌 것을 쓸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생기면 그 기구는 민간기업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로는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퇴출시키자"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부실한 기업이고 금융기관인지는 누구도 100%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 은행이 어느 기업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은행 수익이라는 잣대를 통해 지게 된다. 건실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잘못 판정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이자수입 감소, 담보물건의 경매로 인한 원금손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잘한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부실해져 결국은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에 팔리거나 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출로 먹고사는 은행들도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의 정확성이 절대로 100%일 수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실적감소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공적 자금 운영위원회나 기업구조조정 위워회 또는 금감위나 재경부 심지어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판단을 잘못해도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에게 해당기업이 뇌물을 갖다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이들의 판단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은행이 자기 책임 아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적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국민부담을 최소로 줄이려면,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은행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은행들이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영업할 있도록 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은행을 경영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 김한응 (경제평론가 : hane9kim@chollian.net)
[이 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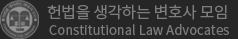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