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목 | 盧 대통령 - 정동영, 한판 붙었다 (프런티어타임스) | ||
|---|---|---|---|
| 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06-05-01 |
| 출처 | 조회수 | 1419 | |
다음은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 에 있는 기사임.
盧 대통령 - 정동영, 한판 붙었다
계급장 떼고 붙은 '힘 겨루기', 得失 분석
입력 : 2006-04-30 14:41:05 편집 : 2006-04-30 14:42:08
노무현 :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
정동영 :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판 붙었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양보를 주문한 것이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답이 주목됐다. 노 대통령의 주문을 수용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노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여당의 ‘오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대답은 달랐다. 정 의장은 30일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후보 입당식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력화, 무효화 전술에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한 거부의사의 표시였다. 노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反旗를 든 것이다. 의외였다.
정 의장의 반발은 5.31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정 의장의 차기대권 도전의 꿈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양보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지지층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근간은 개혁성향이다.
사학법 재개정은 개혁의 후퇴다. 정 의장이 선거를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정 의장의 반발에 노 대통령이 일단 주춤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입법 현안에 대한 고심을 말한 것이지만, 당은 당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당정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주장은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정 의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는 “대통령이 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갖고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며 “어차피 당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오히려 정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이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 의장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이 노 대통령의 심중을 대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 의장 및 여당 의원들의 강경발언을 공식 통로로 보고받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한 참모가 전했다.
이날 청와대도 이번 파문과 관련한 대변인 논평이나 공식 입장 등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이 “당청갈등이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방법론이 달랐던 것”이라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과는 달랐다.
정황을 보면 노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 흔적이 역력하다. 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필요했다.
부동산입법, 주민소환제법, 민방위법 등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원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그랬다.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처리능력을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의 반발로 대통령의 권위에 금이 갔다.
일각에선 ‘레임덕’ 얘기도 나온다. 이제 정 의장이 노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상황이 왔다는 견해다.
하지만 레임덕 주장은 너무 이른 분석이란 지적이 많다. 아직 거기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란 해석이다. 집권여당의 차기대선후보 결정이 멀찌감치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정 의장이 노 대통령을 무시하긴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정 의장은 이번 일로 괜히 노 대통령의 심기만 건드린 셈이다. 사실 여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 대통령이 정 의장을 예뻐할 만한 구석도 별로 없다.
정 의장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레이스에서 노 대통령과 끝까지 완주하며 경선 흥행을 도왔을 뿐 기여한 것도 없다. 노 대통령처럼 재야 민주화운동 동참인사도 아니다.
노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차기대선주자로 내심 바라는 인물은 천정배 법무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해찬 전 총리 등이라고 한다. 천 장관은 노 대통령이 대권주자 지지도 2%일 당시부터 승패에 대한 전망과 관계없이 현역의원 중 가장 먼저 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인사다.
그는 노 대통령과 ‘민주변호사모임’도 함께 했다. 다만 그가 대중들에게 아직 차기대권주자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유 장관은 노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 인사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장관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10%에 싫어하는 사람 90%라는 현실이 한계다. “맞는 말을 가장 싸가지 없게 말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란 김영춘 의원의 인물평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회자(膾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정서가 커 노 대통령이 차기대권주자감으로 눈여겨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정 의장을 좋아하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아직 대안이 없어 여당의 차기대권레이스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 의장의 대중적 인기는 계속 지지부진이다. 시간이 지나도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02년 대선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길 의원보다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곤혹스럽게 됐다. 이런 그를 노 대통령이 아낄 이유가 없다.
이번 노 대통령과의 힘겨루기가 정 의장이 대중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한번 더 심어주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해 노 대통령의 정 의장을 향한 ‘고개 가로젓기’의 진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권노갑 전 의원이 정 의장의 조준사격을 맞고 쓰러지며 배신감을 느꼈듯이...
때문에 정 의장의 계급장을 무시한 이번 도전이 得일지 失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최원영 편집국장danlchoi@frontiertimes.co.kr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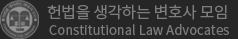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