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목 | 코펜하겐 합의 절반의 성공…험로 예고 (조선닷컴-연합뉴스) | ||
|---|---|---|---|
| 글쓴이 | 조선닷컴-연합뉴스 | 등록일 | 2009-12-21 |
| 출처 | 조선닷컴-연합뉴스 | 조회수 | 1455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
- 입력 : 2009.12.19 19:23 / 수정 : 2009.12.20 00:28
지구온도 상승 2도로 제한 등 성과
세부 감축안, 재정지원 규모, 검증 절차 놓고 격론 예고191개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19일(현지시간) 새벽 밤샘 협상 끝에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공식 인정키로 한 것은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애초 예상보다 일부 진전됐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대다수 국가가 협정에 지지를 밝혔으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지’였고, 일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를 표명한 것은 이번 회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 사실상 미국, 중국 등 소위 G2 간 합의를 통해 협정이 마련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엔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갈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 대립 등으로 2주일 내내 난상토론이 이어진 상황에서 어렵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이다.
협정에 ’유의(take note)’하기로 합의했다는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덴마크 총리) 총회 의장의 발표는 이 같은 이중적 측면을 상징한다. 이것은 협정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회의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 인정,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하고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도 이뤘다.
하지만,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내년 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제16차 총회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은 이번 회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과 빈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했지만 그 규모를 둘러싸고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이 좁혀질지도 미지수다.
◇ 성과 =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관련,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유 비전에 합의를 이룬 점은 이번 회의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군소도서개도국연합(AOSIS)이 주장한 1.5℃ 이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15년 중간 평가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제한 목표치를 1.5℃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준연도(1990년, 2005년, 현재)를 놓고도 이견이 커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기대와 달리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역시 총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다.
선진국은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 300억달러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2012년까지의 긴급자금 3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이 106억달러, 일본이 110억달러, 미국이 36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도국은 그동안 선진국이 매년 2천억~3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터라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탄 토양 및 습지와 같은 자연지형을 보전하는 개도국에 선진국이 보상해주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토탄(土炭) 또는 이탄(泥炭)이란 화본과식물이나 수목질의 유체가 분지에 두껍게 퇴적해 생물화학적인 변화를 받아서 분해되거나 변질된 것으로, 석탄의 한 종류이지만 지표에서 분해작용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석탄과 구별된다.
◇ 남은 쟁점 = 이번 총회는 그러나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수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은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구는 막판에 삭제함으로써 내년에 추진될 협정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게 될지도 의문이다.
합의안은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선진국만 2020년)를 내년 1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으나 역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국 코펜하겐 총회의 가장 큰 목표였던 교통의정서 이후의 체제, 즉 2013년 이후의 선진국 감축 목표 제시 시한을 내년 1월까지 미루고 법적인 구속력 부여 시점도 내년 말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차기총회로 미뤄 알맹이가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이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못박았었다.
그간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16~23%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1990년 기준으로 감축치를 약 40%로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최종적인 감축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는 국가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를 놓고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또 한차례 격론과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개도국이 너무 적다며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다, 선진국이나 선발 개도국 중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낼 것인지 등 분담을 놓고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합의안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부합을 위해 ’국제적인 확인(international checks)’ 절차를 밟되 중국의 주장을 반영해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 개도국이 쉽게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그 방식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선진국은 제3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으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준수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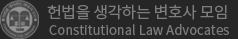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