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임기자
"그와 박정희가 연결되면 양쪽 모두 못마땅하겠지
누구보다 DJ가 더 괴롭겠지 계승자로 믿고 싶었던
그의 잠재의식에 박정희라니… 그러나 세월은 대답하리라"
그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막 정상회담을 끝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였다.
다음 일정인 만찬장으로 옮겨갈 때였다. 그런데 만찬장이 완전히 정돈되지 않았다. 양국 대통령은 대기실에서 15분쯤 기다려야 했다. 그 자리에는 통역사 한 명만 남겨졌다. 당초 그는 노 대통령의 통역을, 알제리 대통령에게는 다른 통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딱 3명만 남게 된 방에서 그가 양쪽 통역을 다 맡게 됐다.
알제리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가보니 김일성 지도자는…" 말문을 열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말 열성적으로 일했다. 그 아들 김정일도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개인적으로 김일성 부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지 칭찬을 한참 이어나갔다. 한국의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의 치적에 대해 떠드는 것은 외교적 결례였다.
통역사는 난감했다. 통역을 안 할 수도,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알제리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통역했다. 순간 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통역사는 분위기를 읽고 조마조마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도 빼지 말고 통역해주세요"하며 그를 쳐다봤다.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지만 북한 주민 상당수가 굶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못살던 농촌과 지방을 바꾸어서 잘살게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힘차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꽉 쥔 주먹을 흔들며 박자를 맞췄다. 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03년 12월 9일 저녁이었다.
통역사가 이 일화(逸話)를 내게 들려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던 탓이다. 이 장면을 과장되게 해석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몰랐던' 노 전 대통령의 한 얼굴이 잠깐 드러났던 게 아닐까. 그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까 봐 어디서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노무현과 박정희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좌·우파 어느 쪽도 못마땅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후(死後) 인기가 박정희와 겹쳐 또 더 올라갈까 걱정할지 모른다. 반면 촛불과 사진을 들고 아직도 덕수궁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추종세력들은 외국정상 앞에서 '박정희의 새마을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는 노 전 대통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며 '동질성'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 괴로울 것이다. 자신의 동지이며 계승자로 믿고 싶었던 그의 잠재의식에 '박정희'가 들어 있다는 것을.
물론 노 전 대통령은 현실에서 박정희 편도 아니었고, 실제 그런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다. 재임 기간 내내 소란스러운 말의 갈등과 반목, 적개심이 끊이질 않았을 뿐이다. 자기가 마음먹었던 것, 자신의 내면(內面)에서 닮고 싶었던 것과는 어쩌면 다른 길을 걸어갔는지 모른다. 대부분 '섣부르고 무모한' 이념추종자들이 그의 동반자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꿈꾸던 자리에서 얼마나 다른 쪽으로 휩쓸려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출발할 때 털끝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千里)나 벌어져 있다. 심지어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를 비웃던 자신이 눈떠 보니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날 청와대 회담이 있었을 때, 국내에는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대선 자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우리가 받은 돈이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둘 것"이라는 노 대통령은 당당했고, '차떼기당' 낙인이 찍힌 한나라당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라며 절망에 떨었다. 집권 정당인 민주당도 '구(舊)세력'으로 몰려 정치 무대의 뒷전으로 밀려갔다. '100년 정당' 열린우리당만이 찬란한 해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시절 풍경은 거의 형체도 없어졌다. 몇 번이나 세월의 '반전(反轉)'이 이뤄졌다. 오늘 한나라당은 '웰빙'하며 떵떵거리고, 민주당은 "놀고 지내니 세비를 반납해라"는 비난에 귀 막고 농성하며, 휩쓸려나갔던 친노(親盧)세력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올라타 되살아나는 중이다. 세월은 어떤 식으로든 냉정하게 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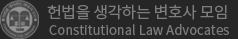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