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목 | 부시 “평화조약” 거론에 盧대통령 “종전선언은…” (동아닷컴) | ||
|---|---|---|---|
| 글쓴이 | 동아닷컴 | 등록일 | 2007-09-10 |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359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
분야 : 정치 2007.9.10(월) 03:06 편집
부시 “평화조약” 거론에 盧대통령 “종전선언은…”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던 7일 호주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미국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공개장소에서 압박했고, … 부시 대통령이 짜증스러워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즉시 "통역의 잘못 때문"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는 9일 "현장분위기를 모르는 외국 언론이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7일 회담 직후 뒤 열린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삐걱거림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
백악관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동영상(10분17초 분량·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9/20070907-3.html)과 영문속기록 그리고 청와대가 시드니에서 취재중인 한국기자단에게 제공한 한국어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봤다.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은 통역부분이 편집된 채 올라있어서 통역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래 기사에 쓰인 시간표시는 백악관 동영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실제 상황=두 대통령은 이른바 모두(冒頭) 발언을 차례로 했다. 노 대통령은 다른 양자현안에 대해 언급한 뒤 자연스럽게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논란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평화협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2차례나 물으면서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08:13)="각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한국통역은 이를 옮기면서 노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I think I might be wrong)"이라는 말을 추가했다.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통역해 평화체제보다는 '종전 선언'에 초점을 맞춰 통역했다.
△부시 대통령(08:42)="한국전을 종결시킬 평화조약(peace treaty)을 서명(sign)하느냐 못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 달려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 그에게 달려 있다."
미국 통역은 대체로 이를 정확히 전달했다. 다만 "평화조약을 서명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대목에서 '서명'이라는 말을 빼고 "평화조약을 하느냐 안하느냐"고 했다. 오히려 청와대가 시드니에서 취재중인 한국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못 통역한 것으로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09:13)=노 대통령은 말을 받아 뭔가를 말하려다가 잠시 가볍게 허허 하고 웃으며 천장을 2초가량 올려다봤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똑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오히려 듣고 싶어 한다."
한국 통역은 이를 "They are the same thing. If you could be a little bit clearer….(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옮겼다. 배석했던 양국 당국자들은 clearer라는 말이 나올 때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부시 대통령(09:40)="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전쟁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씨가 그의 무기에 관해서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 같다. 감사하다(Thank you, sir)"
부시 대통령의 대답은 역시 미국정책의 모범답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말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통역이 끝난 뒤 "Thank you, sir."라는 말을 한번 더 짧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말은 부시 대통령이 회견이나 회담을 마치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10분17초간 TV 카메라 앞에 선 두 정상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서울시간으로 7일 오후 3시45분 경 끝난 이날 언론회동 상황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외교적 관례와 달랐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복잡해 졌다.
AP 통신은 "양국 지도자가 카메라 앞에서 밀고 당김을 했는데 이는 삼가하며 섬세하게 말하는 게 관례인 외교세계에선 놀랄만한 일"이라며 "지도자들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더이상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부시 대통령의 반응은 굳었다"고 보도했다. 또 노 대통령의 말에 미국 대표단은 웃음을 지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듯했고, 부시 대통령은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확인할 때 과연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굳었고, 곤혹스러웠는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시차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뒤 인쇄된 8일자 신문에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고(pressed) 부시 대통령 표정이 짜증스런 표정이었다(irked)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한미정상 회담 직후 있은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노 대통령과의 회동과는 대조적으로 웃음이 넘쳤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이 이 상황에 주목하자 백악관 고든 존드로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통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도 외견상의 긴장에 대해 언론들이 보도하자 백악관이 통역 실수를 탓하며 재빨리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9일 통역실수에 따른 상황전개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통역오류가 있었던 곳을 적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기자단에게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 안보체제에 대해 설명했으나, 미국통역이 막연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노 대통령이 자꾸 물을까'라고 의아해 한 것이다"라고 당시 어색한 상황이 빚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통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미국 통역이 노 대통령이 이 사안을 2차례나 재촉해 묻게 만들 정도로 큰 통역실수를 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국 통역은 "북한지도자가 …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체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영어를 "… (핵을 포기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 평화체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고 한국어로 옮겼다.
이러한 어색함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정국 및 남북정상회담에 필요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유도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정해진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도 이 대목에 주목했다. 8일자 기사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옆자리의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간 적대적 상황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압박했다(publicly pressed the American president to declare a formal end to the hostilities).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썼다.
어색한 회담장면이 생중계된 뒤 워싱턴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한미간에 물밑 시각차가 드러난 측면도 강하다는 뜻이다.
미국은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인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구상해 왔다. 반면 한국정부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말로 하는 선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미국에 비춰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7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줄곧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반복해 말해왔다"며 "이 말은 평양이 아닌 한국정부에게 들으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즉, 한국정부가 비핵화라는 실체를 만져보기 전에 일단 '거대담론 차원의 선언'을 먼저 내놓으려고 하는데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다.
실제로 7일 정상회담 후 TV 카메라 앞에 선 10여분 동안 부시 대통령은 "평화조약(Peace Treaty)"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썼다. 반면 노 대통령의 말은 "종전선언(Declaration)"으로 통역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시드니=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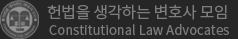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