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목 | 美, 세율 내리니 세수 급증…‘래퍼 이론’ 들어맞나? (동아닷컴) | ||
|---|---|---|---|
| 글쓴이 | 김승현기자 | 등록일 | 2006-07-11 |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629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美, 세율 내리니 세수 급증…‘래퍼 이론’ 들어맞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름이면 텍사스 크로퍼드의 개인 소유 목장에서 휴가 겸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져 왔다. 평소 보고 싶었던 사람을 초청하기도 한다.
올여름 부시 대통령의 ‘크로퍼드 손님’을 미리 꼽으라면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66) 박사가 1순위가 될지 모른다.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래퍼 박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뜻밖의 세수(稅收)’ 때문이다. 11일 미 정부가 발표할 2006 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의 9개월 동안 세수 규모는 한마디로 예상 밖이다. 뉴욕타임스는 10일 “9월 말이면 세수가 예상을 깨고 지난해보다 2500억 달러(약 250조 원) 더 걷힐 전망이고, 연간 재정적자는 6개월 전 예상치보다 1000억 달러 줄어든 3000억 달러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깜짝 세수 증대가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첫 9개월간 걷힌 법인세가 2500억 달러로 2003년보다 3배나 늘었고, 경영진에 지급되는 대규모 보너스와 주식투자자들의 수익에 매긴 세금징수액이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부시 행정부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자 및 기업 감세정책’은 민주당으로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지만, 실물경제 현장에서는 옳았음이 입증됐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래퍼 박사의 이론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세수는 증대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모처럼 나온 호재를 십분 활용했다. 그는 “(공화당의 감세정책이) 미국의 기업가정신을 꽃피우게 했다”고 말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올해 초 “재무부 안에 세금 삭감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할 연구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2월 사설을 통해 “세금과 경기호전의 상관관계는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체니 부통령이 언급한) 이론적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래퍼 박사와 체니 부통령의 오랜 인연. 1974년 워싱턴 시내의 한 칵테일 바에서 래퍼 박사는 종이 냅킨 위에 자기 이론의 핵심을 써내려 갔다. 바로 ‘래퍼 곡선’이다. 그 자리에 당시 백악관 비서실 차장이던 체니 부통령이 앉아 있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래퍼 이론:
최대한의 조세수입이 보장되는 세율이 어떤 수준인지를 찾는 이론. 세율이 0%면 세금수입이 전무다. 반대로 100%도 마찬가지. 아무도 소득을 창출하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면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선가 세수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래퍼 이론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행정부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아서 래퍼 박사의 이론은 “최적세율은 통념보다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착안점을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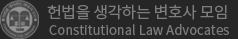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